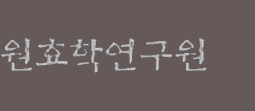설화 및 전설 원효스님과 혜공스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453회 작성일 18-05-15 00:52본문
<포항영일·오어사>
신라의 혜공스님은 천진공의 집에서 품팔이하던 노파의 아들로 어릴 때 이름은 우조였다.
어느 해 여름. 천진공이 심한 종기를 앓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니 문병하는 사람이 집앞을 메웠다. 그때 우조의 나이는 7세였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나요?』
『주인 어른께서 나쁜 병에 걸려 장차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무리 어려 철이 없기로서니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그 병을 고치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 병을 고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글쎄 두고 보면 아실 테니 어서 주인 어른께 허락을 받아 주세요.』
노파는 아들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인에게 말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느라 애쓰던 천진공에겐 아무리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반가운 소리였다.
『어서 우조를 가까이 들도록 해라.』
부름을 받은 우조는 천진공의 침상 밑에 앉아만 있을 뿐 이렇다 할말도 움직임도 보이질 않았다.
『우조야,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이 종기를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조는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때다. 천진공의 종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인은 우연한 일로만 생각하고 별로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그 후 우조는 자라면서 주인을 위해 매를 길러 길들였는데 이것이 아주 천진공의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천진공의 동생이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하게 되자 천진공은 매를 한 마리 골라 주었다. 동생이 매를 갖고 임지로 떠난 뒤 얼마 안되어 천진공은 갑자기 그 매 생각이 났다.
『내일 새벽 일찍이 우조를 보내 그 매를 가져오게 해야지.』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우조는 그 매를 가져다가 새벽녘에 천진공에게 바쳤다.
『아니 우조야, 네 어찌 내 심중을 알고 이 매를 가져왔느냐?』
우조는 다만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 말이 없었다.
천진공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난날 종기를 고친 것도 모두가 우조의 범상치 않은 힘에 의한 것임을.
『나는 지극한 성인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으로 욕을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부디 도사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진공은 엎드려 절을 하며 지난날을 참회했다.
신령스런 현상을 자주 나타낸 우조는 마침내 출가하여 혜공스님이 되었다.
스님은 작은 절에 살면서 늘 술에 취한 채 삼태기를 지고는 노래하고 춤추며 미친 듯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궤화상이라 부르고스님이 사는 절을 삼태기란 뜻에서 부개사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 또 우물 속에서 나올 때면 푸른 옷을 입은 신동이 먼저 솟아 나왔으므로 대중들은 이를 조짐으로스님이 우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 더욱이 몇 달만에 우물에서 나와도스님의 옷은 젖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대중을 놀라게 했다.
만년에는 경북 영일군 항사리에 있는 항사사(지금의 오어사)에 주석했다. 그 무렵 원효대사는 많은 불경의 소(疏)를 찬술하고 있었는데 자주 혜공스님에게 묻고 혹은 서로 농담을 나누었다.
어느 날 두스님은 절 근처에 있는 시내를 따라가면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었다. 이때 원효스님이 갑자기 괴춤을 내리더니 바위 위에다 방변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혜공스님은 허허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자네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일 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 항하사처럼 많은 사람이 출세했다 하여 항사동 항사사라 불리우던 절 이름은 오어사로 바꿔 부르게 됐다.
지금도 오어사에는 원효스님의 삿갓이 보관되어 있다. 요즘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섬세한 발보다 10배나 더 정교한 풀뿌리로 짜여진 이 삿갓의 높이는 1척이고 밑의 직경은 1.5척이다. 뒷부분은 거의 삭아 버렸는데 겹겹이 붙인 한지에 붓글씨가 쓰여져 천 년 세월을 되돌아 보게 한다.
혜공스님의 이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느날 구참공이 산에 놀러갔다가 혜공스님이 산길에 쓰러져 죽은 것을 보았다. 시체가 부어 터지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난 것을 보고는 오랫동안 슬피 탄식하다 말고삐를 돌려 성에 돌아오니 혜공이 술에 몹시 취해 시장 안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참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틀림없이 여느 날과 다름없는 혜공스님이었으므로 재삼스님의 도력에 감탄했다.
또 어느 날은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영묘사에 들어가서 금당과 경루, 남문의 낭무를 묶어 놓고 강사에게 말했다.
『이 새끼를 3일 후에 풀도록 해라.』
과연 3일만에 선덕왕이 절에 왔는데 선덕왕을 연모한 지귀의 심화(心火)가 절의 탑을 태웠지만 새끼로 맨 곳은 화재를 면했다.
이처럼 신령스러운 자취를 많이 남긴 혜공스님은 공중에 떠서 열반했는데 사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출현했다.
그는 열반 전 어느 날 《조론》을 보고는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그이다』고 말했다. 일연스님은 이로써 혜공스님이 조론의 필자인 승조(후진 때 스님)의 후신임을 알았다고 《삼국유사》에 밝혔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신라의 혜공스님은 천진공의 집에서 품팔이하던 노파의 아들로 어릴 때 이름은 우조였다.
어느 해 여름. 천진공이 심한 종기를 앓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니 문병하는 사람이 집앞을 메웠다. 그때 우조의 나이는 7세였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나요?』
『주인 어른께서 나쁜 병에 걸려 장차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무리 어려 철이 없기로서니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그 병을 고치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 병을 고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글쎄 두고 보면 아실 테니 어서 주인 어른께 허락을 받아 주세요.』
노파는 아들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인에게 말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느라 애쓰던 천진공에겐 아무리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반가운 소리였다.
『어서 우조를 가까이 들도록 해라.』
부름을 받은 우조는 천진공의 침상 밑에 앉아만 있을 뿐 이렇다 할말도 움직임도 보이질 않았다.
『우조야,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이 종기를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조는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때다. 천진공의 종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인은 우연한 일로만 생각하고 별로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그 후 우조는 자라면서 주인을 위해 매를 길러 길들였는데 이것이 아주 천진공의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천진공의 동생이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하게 되자 천진공은 매를 한 마리 골라 주었다. 동생이 매를 갖고 임지로 떠난 뒤 얼마 안되어 천진공은 갑자기 그 매 생각이 났다.
『내일 새벽 일찍이 우조를 보내 그 매를 가져오게 해야지.』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우조는 그 매를 가져다가 새벽녘에 천진공에게 바쳤다.
『아니 우조야, 네 어찌 내 심중을 알고 이 매를 가져왔느냐?』
우조는 다만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 말이 없었다.
천진공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난날 종기를 고친 것도 모두가 우조의 범상치 않은 힘에 의한 것임을.
『나는 지극한 성인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으로 욕을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부디 도사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진공은 엎드려 절을 하며 지난날을 참회했다.
신령스런 현상을 자주 나타낸 우조는 마침내 출가하여 혜공스님이 되었다.
스님은 작은 절에 살면서 늘 술에 취한 채 삼태기를 지고는 노래하고 춤추며 미친 듯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궤화상이라 부르고스님이 사는 절을 삼태기란 뜻에서 부개사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 또 우물 속에서 나올 때면 푸른 옷을 입은 신동이 먼저 솟아 나왔으므로 대중들은 이를 조짐으로스님이 우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 더욱이 몇 달만에 우물에서 나와도스님의 옷은 젖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대중을 놀라게 했다.
만년에는 경북 영일군 항사리에 있는 항사사(지금의 오어사)에 주석했다. 그 무렵 원효대사는 많은 불경의 소(疏)를 찬술하고 있었는데 자주 혜공스님에게 묻고 혹은 서로 농담을 나누었다.
어느 날 두스님은 절 근처에 있는 시내를 따라가면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었다. 이때 원효스님이 갑자기 괴춤을 내리더니 바위 위에다 방변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혜공스님은 허허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자네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일 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 항하사처럼 많은 사람이 출세했다 하여 항사동 항사사라 불리우던 절 이름은 오어사로 바꿔 부르게 됐다.
지금도 오어사에는 원효스님의 삿갓이 보관되어 있다. 요즘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섬세한 발보다 10배나 더 정교한 풀뿌리로 짜여진 이 삿갓의 높이는 1척이고 밑의 직경은 1.5척이다. 뒷부분은 거의 삭아 버렸는데 겹겹이 붙인 한지에 붓글씨가 쓰여져 천 년 세월을 되돌아 보게 한다.
혜공스님의 이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느날 구참공이 산에 놀러갔다가 혜공스님이 산길에 쓰러져 죽은 것을 보았다. 시체가 부어 터지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난 것을 보고는 오랫동안 슬피 탄식하다 말고삐를 돌려 성에 돌아오니 혜공이 술에 몹시 취해 시장 안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참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틀림없이 여느 날과 다름없는 혜공스님이었으므로 재삼스님의 도력에 감탄했다.
또 어느 날은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영묘사에 들어가서 금당과 경루, 남문의 낭무를 묶어 놓고 강사에게 말했다.
『이 새끼를 3일 후에 풀도록 해라.』
과연 3일만에 선덕왕이 절에 왔는데 선덕왕을 연모한 지귀의 심화(心火)가 절의 탑을 태웠지만 새끼로 맨 곳은 화재를 면했다.
이처럼 신령스러운 자취를 많이 남긴 혜공스님은 공중에 떠서 열반했는데 사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출현했다.
그는 열반 전 어느 날 《조론》을 보고는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그이다』고 말했다. 일연스님은 이로써 혜공스님이 조론의 필자인 승조(후진 때 스님)의 후신임을 알았다고 《삼국유사》에 밝혔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