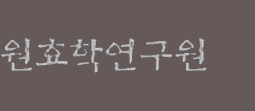설화 및 전설 호로병의 신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10,171회 작성일 18-05-15 00:53본문
<부산시 동래·원효대>
『대선아.』
『네, 스님.』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다섯 개만 구해 오너라.』
『갑자기 호로병은 뭐 하실려구요?』
『쓸 데가 있느니라. 어서 사시마지 올리기 전에 다녀오너라.』
대선 사미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큰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들었다.
『어떻게 할까?』
지그시 눈을 내려감은 원효 스님은 수차의 자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쪽을 택했다. 스님은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5만 왜구를 살생키로 각오했다. 그것은 무고히 짓밟힐 신라 백성을 구하면서 적군 마저도 살생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보살심이었다.
5만 명 살생이란 큰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는 결심이 서자 원효 스님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후련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때 저 멀리 수평선에 하나 둘 까만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배들이 동해를 까맣게 덮었다. 왜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 지금으로부터 약 1천3백년 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일본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함대와 동해안 지방을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그럴 때마다 태평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배를 만들고 군사를 길렀다. 그러자 왜구는 몇 년간 뜸했다.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졌다. 이 틈을 노려 왜구의 대병선단이 물밀듯 밀어닥친 것이었다.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왜구는 일로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채비를 차렸다. 이들은 동래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 놓았다. 원효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계략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미 그의 나이 60여 세. 이제 자신의 생애에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파란 많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20세 젊은 나이에 구도의 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홀연 자성을 깨달은 지 어언 40여 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떼와의 생활 등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계는 일찍이 없었다.
『5만의 목숨을 살릴 길은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 놓고 암자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테니 가보아라.』
『가서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도리 것이니라.』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 사미는 뱃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왜말을 하고 있었다.
『장군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 대군이 있을 걸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성벽 안에 신라 군사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하니 성벽 안에 군사는 있을 리 없네. 저 장군기는 무슨 곡절이 있을테니 올라가 알아보세.』
둘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미승은 뒤를 따랐다. 산 중턱쯤 오르자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 서 있는 사미승을 보고 손짓해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을 가려는데 안내 좀 해주겠느냐?』
『그러구 말구요. 저 절은 제가 사는 미륵암이에요. 함께 가시죠.』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니?』
『아뇨.』
이들이 왜국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두 녀석이 막 길을 내려가는데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손은 잠깐 들렀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냥 돌아가렵니다. 다음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뇨.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야,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냐, 달아나면 의심을 살 테니 구경이나 해보자.』
어쩔 수 없이 암자에 들어선 두 녀석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이런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왜군을 만났겠군.』
『왜군이라뇨? 못 봤는데요.』
『못 봤다구? 네가 네 자신을 못 봤다고 하다니, 너희가 왜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에서 비수를 꺼내 스님을 향해 찔렀다. 순간,
『네 이놈!』
대갈일성과 함께 선사의 주장자가 허공을 쳤다. 칼을 빼든 왜군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를 본 한 녀석은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다른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다섯 개를 나란히 놓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어기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대군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선사는 붓을 들어 호로병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다. 그러자 두 녀석의 목이 아프면서 조여들었다. 그리고 목에는 호로병과 같은 핏멍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두 녀석은 공포에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빌었다. 스님은 다섯 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갖고 너희 대장에게 가서 일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 녀석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보고했다.
『뭣이? 이 따의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거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칼을 들어 호로병을 쳤다. 병이 깨지는 순간 대장의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졌다. 놀란 왜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지금도 동래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에 가면 원효대 바위가 있고 바위에는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가 움푹 파인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5리쯤 올라가면 미륵암이 있고 그 뒤로 성벽이 있어 원효 스님의 자재했던 신통력을 재음미케 한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대선아.』
『네, 스님.』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다섯 개만 구해 오너라.』
『갑자기 호로병은 뭐 하실려구요?』
『쓸 데가 있느니라. 어서 사시마지 올리기 전에 다녀오너라.』
대선 사미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큰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들었다.
『어떻게 할까?』
지그시 눈을 내려감은 원효 스님은 수차의 자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쪽을 택했다. 스님은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5만 왜구를 살생키로 각오했다. 그것은 무고히 짓밟힐 신라 백성을 구하면서 적군 마저도 살생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보살심이었다.
5만 명 살생이란 큰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는 결심이 서자 원효 스님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후련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때 저 멀리 수평선에 하나 둘 까만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배들이 동해를 까맣게 덮었다. 왜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 지금으로부터 약 1천3백년 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일본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함대와 동해안 지방을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그럴 때마다 태평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배를 만들고 군사를 길렀다. 그러자 왜구는 몇 년간 뜸했다.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졌다. 이 틈을 노려 왜구의 대병선단이 물밀듯 밀어닥친 것이었다.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왜구는 일로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채비를 차렸다. 이들은 동래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 놓았다. 원효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계략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미 그의 나이 60여 세. 이제 자신의 생애에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파란 많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20세 젊은 나이에 구도의 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홀연 자성을 깨달은 지 어언 40여 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떼와의 생활 등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계는 일찍이 없었다.
『5만의 목숨을 살릴 길은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 놓고 암자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테니 가보아라.』
『가서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도리 것이니라.』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 사미는 뱃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왜말을 하고 있었다.
『장군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 대군이 있을 걸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성벽 안에 신라 군사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하니 성벽 안에 군사는 있을 리 없네. 저 장군기는 무슨 곡절이 있을테니 올라가 알아보세.』
둘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미승은 뒤를 따랐다. 산 중턱쯤 오르자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 서 있는 사미승을 보고 손짓해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을 가려는데 안내 좀 해주겠느냐?』
『그러구 말구요. 저 절은 제가 사는 미륵암이에요. 함께 가시죠.』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니?』
『아뇨.』
이들이 왜국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두 녀석이 막 길을 내려가는데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손은 잠깐 들렀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냥 돌아가렵니다. 다음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뇨.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야,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냐, 달아나면 의심을 살 테니 구경이나 해보자.』
어쩔 수 없이 암자에 들어선 두 녀석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이런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왜군을 만났겠군.』
『왜군이라뇨? 못 봤는데요.』
『못 봤다구? 네가 네 자신을 못 봤다고 하다니, 너희가 왜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에서 비수를 꺼내 스님을 향해 찔렀다. 순간,
『네 이놈!』
대갈일성과 함께 선사의 주장자가 허공을 쳤다. 칼을 빼든 왜군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를 본 한 녀석은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다른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다섯 개를 나란히 놓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어기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대군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선사는 붓을 들어 호로병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다. 그러자 두 녀석의 목이 아프면서 조여들었다. 그리고 목에는 호로병과 같은 핏멍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두 녀석은 공포에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빌었다. 스님은 다섯 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갖고 너희 대장에게 가서 일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 녀석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보고했다.
『뭣이? 이 따의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거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칼을 들어 호로병을 쳤다. 병이 깨지는 순간 대장의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졌다. 놀란 왜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지금도 동래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에 가면 원효대 바위가 있고 바위에는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가 움푹 파인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5리쯤 올라가면 미륵암이 있고 그 뒤로 성벽이 있어 원효 스님의 자재했던 신통력을 재음미케 한다.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